2020. 6. 23. 15:09ㆍ책check, 북애프터문!

바깥은 여름
김애란 │문학동네
#책check * 서평이라기 보다는 단상에 가깝습니다.
총평: ★★★★
조금 맘이 여유가 있거나, 아예 무너지고 싶은날 읽는다면 추천입니다
목차:
입동 _007
노찬성과 에반 _039
건너편 _083
침묵의 미래 _121
풍경의 쓸모 _147
가리는 손 _185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_223
작가의 말 _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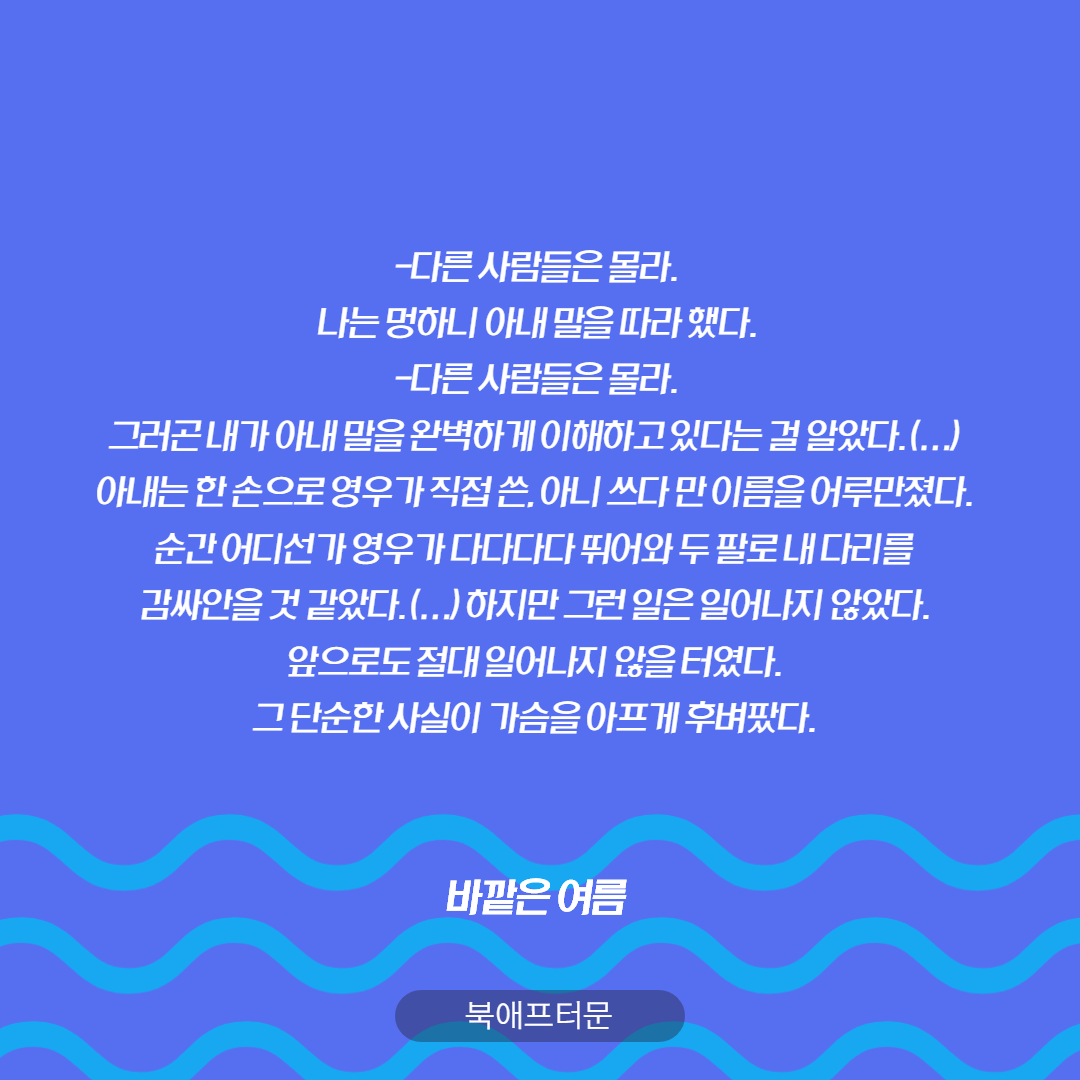
-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멍하니 아내 말을 따라 했다.
-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곤 내가 아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내는 한 손으로 영우가 직접 쓴, 아니 쓰다 만 이름을 어루만졌다. 순간 어디선가 영우가 다다다다 뛰어와 두 팔로 내 다리를 감싸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터였다. 그 단순한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후벼팠다.
여러 단편을 모아놓은 책인데, 편집 한 번 잔인하기도 하여라. 첫번째 이야기는 자식을 잃은 부모에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까지 감정을 절절히 드러낼 수 있구나 싶었다. 물론 경험과의 오버랩때문이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워서 새벽 세시가 넘도록 잠을 설치기도 했다.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너무 답답하네ㅠㅠ 겉모습만 묘사했을 뿐인데 그 속마음과 생각들까지 들여다보인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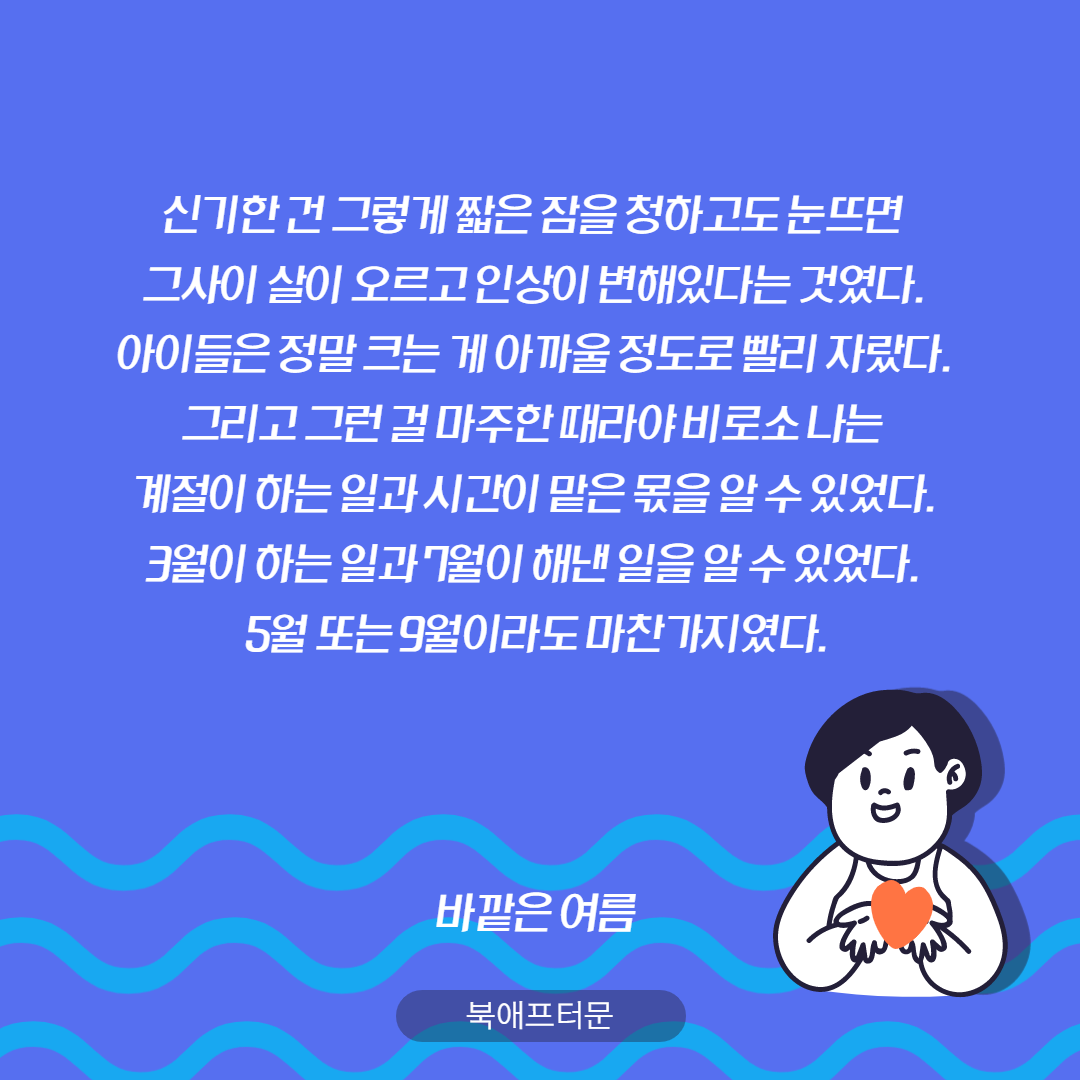
신기한 건 그렇게 짧은 잠을 청하고도 눈 뜨면 그 사이 살이 오르고 인상이 변해있다는 거였다. 아이들은 정말 크는 게 아까울 정도로 빨리 자랐다. 그리고 그런 걸 마주한 때라야 비로소 나는 계절이 하는 일과 시간이 맡은 몫을 알 수 있었다. 3월이 하는 일과 7월이 해낸 일을 알 수 있었다. 5월 또는 9월이라도 마찬가지였다.
4일 만에 다 읽었다. 사실 책 표지를 보고 여름의 푸르름이 느껴지는 산뜻한 책이겠거니 멋대로 생각하고 읽고싶어했었다. 그러다 동료의 책장에서 보고 빌려 읽게되었다. 마음에 아무 부담도 주지 않는, 가벼운 스낵같은 글이 읽고 싶다는게 최근 책 선정의 기준인데 이번 선택은 실패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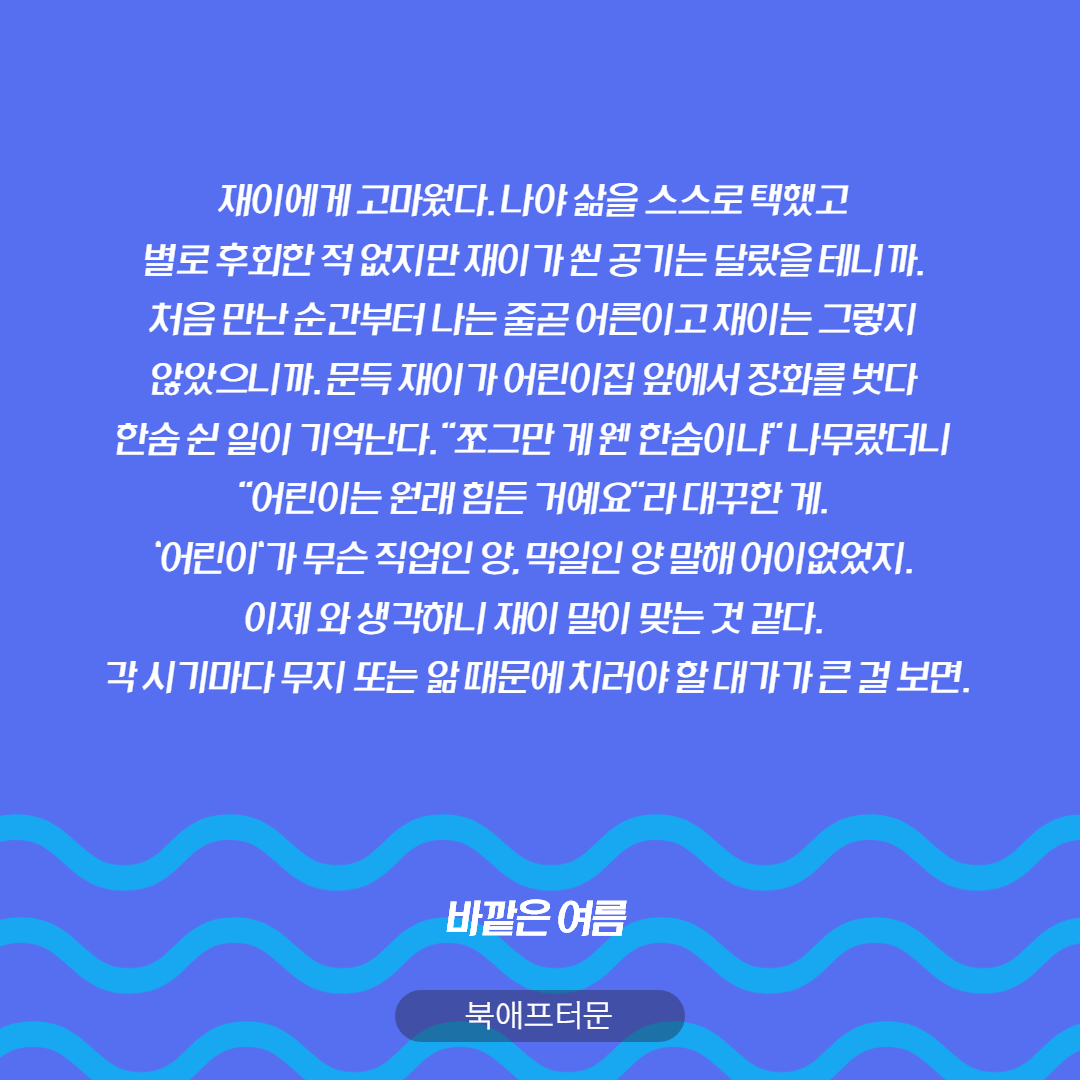
재이에게 고마웠다. 나야 삶을 스스로 택했고 별로 후회한 적 없지만 재이가 쐰 공기는 달랐을 테니까.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는 줄곧 어른이고 재이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문득 재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장화를 벗다 한숨 쉰 일이 기억난다. "쪼그만 게 웬 한숨이냐" 나무랐더니 "어린이는 원래 힘든 거에요"라 대꾸한 게. '어린이'가 무슨 직업인 양, 막일인 양 말해 어이없었지. 이제 와 생각하니 재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각 시기마다 무지 또는 앎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큰 걸 보면.
암튼... 다른 이야기들은 이 이상의 임팩트가 있진 않았다. 첫 이야기에서 너무 진을 빼놓은 것 아니냐!!!하는 원망을 소심하게 편집자께(?) 전해본다..

수사도, 과장도, 왜곡도 없는 사실의 문장을 신뢰했다. 이를테면 '내부순환로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차량이 증가해 정체가 예상된다'거나 '올림픽대로 성수대교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났으니 안전 운행하시라'와 같은 말들을. 더구나 그 말은 세상에 보탬이 됐다. 선의나 온정에 기댄 나눔이 아닌 기술과 제도로 만든 공공선. 그 과정에 자신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꼈다.
난 책을 읽을 때 작가의 말을 읽지 않는다. 할 말있음 작품으로 해야지, 수백장의 말들을 풀어놓고 이제와서 또 할말이 남으면 어쩌냐 싶은 건방진 마음에서다. 그런데 특이하게 마지막 한장, 여백이 많은 딱 한장에 작가의 말이 있어 못다한 말이 뭘까 하고 읽어봤다. 못다한 말이라기보단 작가가 글을 만나는 과정?이랄까. 여전히 작가가 좇고 있을, 혹은 과거에 좇았을 인물들이 궁금해져 다른 책도 읽어볼까 싶어진다.
김애란작가의 소설은 처음 읽었는데, 문체나 표현들이 아주 맘에 들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은 약간 반복적인 패턴의 표현들이 살짝 거슬려서 한권 더 읽었다가 질리진 않을까 싶은것..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

'책check, 북애프터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기, 우리, 함께│#1 오래도록 싸우고 곁을 지키는 사람들, 그 투쟁과 연대의 기록 (0) | 2020.07.13 |
|---|---|
| 안나 카레니나 │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다" (0) | 2020.06.26 |
|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지금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0) | 2020.06.19 |
| 책 구매목록 │ 2020년 6월 알라딘 굿즈 추천 (0) | 2020.06.19 |
| 회사가 괜찮으면 누가 퇴사해- 청년들의 불안하고 불행한 일터에 관한 보고서 (0) | 2020.06.18 |